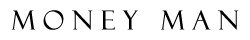[에세이] 변덕을 인정하고 관대하게 살아라
난 내 변덕에 관대해지기로 했다. 뭔가를 시작한 이래 계속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건 운동과 글쓰기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사랑한 재즈조차 요샌 잘 안 듣는다.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최근엔 디자인 책을 잔뜩 버렸다. 프리랜서 시절 직업이 디자이너였고 디자인 에이전시도 운영했으니 내가 디자인을 얼마나 사랑했겠나. 온종일 디자인만 해도 지겹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관심 없다.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다가 별거 아닌 계기로 차갑게 식으면 자괴감을 느끼곤 했다. 어떻게 사람 감정이 이렇게 빠르게 들쑥날쑥할 수 있는지 한탄했다. 이젠 그냥 인정한다. 내 변덕을. 어제는 좋았어도 오늘은 안 좋을 수 있다. 물론 내 변덕만큼 상대가 내게 이러는 것에도 관대하다. 어제까지 내 베프라 하던 사람이 오늘 나를 버린다고 해도 마음 쓰지 않기로 했다. 뭔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설령 이유가 없어도 그 변한 마음과 선택을 존중한다.
좋아하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 마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오래가지도 않으니 좋아하는 일 못 했다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굴지 말란 거다. 인생에 유일한 사랑과 결혼한 것처럼 말했던 분이 재혼한 것도 봤다. 어떤 확신도 잘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건 세상 모든 일은 상황 따라 바뀔 수 있고 내게 그걸 제어할 강한 힘이 있는가 뿐이다. 난 내 능력만 믿을 뿐 다른 모든 건 변수로 둔다. 심지어 이 생각조차 언제든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