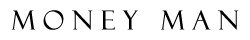[에세이] 덜 피곤하고 더 현명한 처세로 사는 방법
어릴 땐 거짓말하는 게 병적으로 싫었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해선 안 될 말도 하며 이래저래 말실수가 많았다. 솔직함을 핑계로 무례했던 적도 많다.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지 못했다. 상대의 사소한 거짓말에 집착하고 추궁하곤 했다.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모르고 지나치게 단순한 방식으로 재단하고 평가했다. 그 시절 내 그릇은 그렇게 작았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제대로 담을 수 없었다.
가벼운 거짓말은 오히려 예의를 고려한 처세일 때가 많다.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사회생활의 하나다. 이걸 이해한 후론 상대가 날 속여도 딱히 내색하거나 지적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피해 보는 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려니 한다. 손해가 있더라도 웬만한 수준이면 감수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사과해서 상대방 화가 풀어질 수 있다면 먼저 사과하는 편이다. 이런 게 억울하지 않다.
나이 들수록 화내거나 따지는 일이 계속 줄어든다. 어떤 것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언제 마지막으로 화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상대 위선이나 거짓말 같은 게 좋을 리 없지만,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고 그 정도 잘못은 덤덤히 받아들일 만큼 무뎌진 것도 있다. 이렇게 사는 게 덜 피곤하고 더 현명한 처세임을 받아들이게 된 셈이다. 물론 적당히 웃어넘긴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다. 상대를 인정 하기보단 포기한 것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