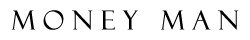[에세이] 연애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
협상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 안 될 것 같은 건 바로 느낌이 온다. 이건 연애도 마찬가지. 데이트 한 번만 해도 상대와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다. 사업에선 이 결단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편이지만, 연애는 그 반대다.
비딩 들어가기 전부터 절대 안 될 것 같은 프로젝트가 있었다. 우리는 그냥 들러리고 사실상 할 팀이 이미 다 내정돼 있던 일이라 구색만 적당히 맞추고 나오면 되는 자리였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내가 PT에 온 힘을 다했고 어이없게도 우리가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당연히 안 될 일이라 생각했던 게 포기하지 않으니 일종의 세렌디피티가 된 셈이다. 이게 인생의 너무 강렬한 경험으로 남아서 아직도 인간관계에선 이런 기적을 기대하곤 한다. 남한텐 상대 반응 안 좋으면 바로 포기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하면서 정작 나는 그러지 않는 이유다.
기적이 자주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다. 이런 방식은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연애에 끝까지 근성을 발휘하는 건 한 줌의 아쉬움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다. 미련할 만큼 노력하면 미련이 남지 않는다. 적어도 연애만큼은 이성보단 이런 본능을 선호한다. 가끔은 기적이 있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