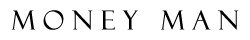[에세이] 항상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라
모든 일엔 끝이 있다. 단지 그게 언제일지 모를 뿐. 어릴 땐 뭐든 다음 기회가 있는 줄 알았다. 에디 히긴스 공연 보러 가는 걸 미뤘을 때 사실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았다. 다음에 보면 되니까. 하지만 그게 마지막 공연이었다. 노인은 교통사고가 나도 자연사란 농담이 있지만, 왜 당연히 다음 공연이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
기흉으로 일주일간 병동에 누워 있을 때 맞은편 병상에 중환자가 있었다. 새벽에 자전거 타고 나왔다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어르신. 사고는 잠깐이었지만 그 가족의 모든 인생은 그날부로 사고에 저당 잡혔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새벽에 집을 나올 때 그런 사고를 당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헤어질 땐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편이다. 왠지 이번 만남이 끝은 아닐까 그런 기분이 들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에 만남의 여운을 오래 남기고 싶다. 원하든 원치 않든 금방 볼 것 같은 사이도 몇 년씩 못 보는 건 부지기수다. 인연의 끈이 그것밖에 안 됐다고 넘기기엔 세상사 참 마음대로 안 된다.
아직 젊지만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 죽고 싶다거나 인생이 허무하고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걸 늘 인지한다는 얘기다. 삶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걸 떠올린다면 뭐든 홀가분하게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다. 하지만 대부분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