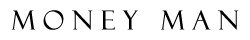[에세이] 인간관계에 애쓸 필요 없는 이유
사람이 참 어렵다. 뭔가 다 알 것 같다가도 간혹 전혀 예상 못 한 상황을 경험하면 다시 평가해 보게 된다. 예전엔 내가 눈치가 부족해서 그런 실수를 하나 싶었는데 요즘은 그 생각도 그냥 내려놨다. 나도 내 맘을 모르는데 상대라고 뭘 알아서 그러겠나. 흘러가는 대로 맞춰서 사는 게 인연이고 어긋나면 내 몫이 아닌 거다.
예전엔 좋아하는 사람들을 친한 동생이라거나 형이라는 식으로 다른 지인에게 소개해 주곤 했다. 근데 친하다는 표현은 내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관계이고 상대 동의는 없는 거니까 뭔가 어폐가 있는 말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아끼는 동생 같은 표현으로 바꿔 쓴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실제로도 나와 친하길 바랄 뿐이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건 나도 나를 모르고 상대도 본인 마음을 몰라서다. 그냥 서로 아는 게 없다. 다들 그렇게 되는 대로 맞춰가다가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끊기고 무탈하면 계속 가고. 그러다 접점이 사라지면 조용히 멀어진다. 애쓴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니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 어릴 땐 미처 몰랐던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