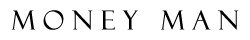[에세이] 인간관계를 좁히고 소수에게 집중하라
인간관계 슬롯이 많지 않은 편이다. ‘던바의 수’로 유명한 옥스퍼드대 로빈 던바 교수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집단의 숫자를 150명 정도라고 했지만, 난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 같다. 페친이 다 찬 지 한참 됐는데도 여전히 이름이 인식되는 인원은 10%도 안 되는 것 같고 평소 오프라인에서 꾸준히 만나는 사람은 50명도 안 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친구 숫자가 거의 다 차서 새로운 사람을 사귈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이름 외우는 건 로봇처럼 잘하는 편인데도 이름 헷갈리는 경험을 하니까 종종 현타가 온다. 요샌 불특정 다수를 동시에 봐야 하는 모임 같은 곳은 웬만하면 피하고 가더라도 상대방 이름이나 신상을 묻지 않는다. 불필요한 정보를 쌓기 싫어서.
인간관계에서 아쉬울 게 없어지니 새로운 외부 활동을 점점 안 하게 된다. 누군가를 알아 나가는 과정을 귀찮다고 느낀 건 살면서 처음이다. 뭐든 처음 보는 건 다 설렘을 느끼는 성향이었는데 나이가 드니 이런 정서 변화를 다 겪는다. 인간관계를 좁히고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더 자연스러운 방향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