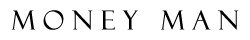[에세이] 성실함은 그 자체가 보상이다
모든 일엔 좋고 나쁨의 흐름이 있다. 사람들이 좋아해 줄 때도 있지만, 싫어할 때도 있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지독하게 꼬일 때도 있고. 난 이미 이걸 10년 넘게 수많은 플랫폼에서 경험했다. 잘 된다고 신나 하지 않고 안 된다고 낙담하지 않는 건 이 모든 게 찰나일 뿐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꼭 지키려는 건 항상 내 할 일을 제때 하는 거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할 뿐. 연인과 이별한 밤에도 사무실에 들어와 새벽까지 정해진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그 뒤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룬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주위에서 이런 나를 융통성 없다고 생각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난 모든 일을 팔만대장경 만드는 심정으로 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성실함을 인지한다. 이것 자체가 내겐 보상이다. 누구나 열심히 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거기에 소명 의식을 부여하는 이는 별로 없다. 그런 성실함은 늘 타협의 여지를 남긴다. 도망갈 기회가 있으면 도망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퇴로를 미리 끊는 결단 없이 지독한 꾸준함이 과연 가능할까? 미련함과 꾸준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융통성 없는 근성 없인 탁월한 성실함도 있을 수 없다. 자기 일을 함에 있어 함부로 이 원칙을 저버려선 안 된다. 성실함이 극에 달하면 다른 차원에 눈뜬다. 이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