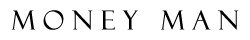[전략] 단순함이 중요한 4가지 이유
“단순화하라, 단순화하라.”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 책은 2014년에 읽은 책 중 단연 최고였다. 켄 시걸의 책 ‘미친듯이 심플’은 단순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정말 제대로 역설한다. 무슨 일을 하든 ‘제대로 단순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다.
1. 단순해야 이해하기 쉽다
어떤 회사의 모니터 제품군은 너무 복잡하다.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사소한 기능 하나에도 여러 모델로 나눈다. 심지어 판매처 별로 같은 제품이 다른 모델명을 갖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업 사원도 상품 설명을 제대로 못 한다. 모델명을 복잡하게 나누면 파는 사람도 어렵고 사는 사람도 어렵다. 하나의 디자인에 하나의 모델명만 부여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2. 단순해야 선택하기 쉽다
뭔가를 사려고 하는데 옵션이 수십 가지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선택은 그것이 뭐든 압박감을 준다. 복잡한 선택지는 보는 것조차 스트레스다. 판매자는 고객의 선택지를 줄여줘야 한다. 취향 맞추겠다고 수십 가지 보여줘 봤자 고객은 보기 수십 개짜리 시험문제 푸는 느낌만 받는다. 마트에서 잼 종류를 다양하게 늘렸더니 판매량이 오히려 줄었다는 실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단순해야 집중하기 쉽다
사이트 메뉴가 너무 많으면 뭐가 어딨는지 찾기 어렵다. 심지어 너무 복잡하다 느끼면 그냥 나가는 사람도 많다. 사이트 제작할 때 하는 큰 실수 중 하나가 메뉴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이다. 단순하면 집중하기 좋다. 복잡하면 이것저것 분산돼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책상 위에 책을 한 권만 놓아두면 반드시 읽게 되지만, 수십 권을 쌓아두면 한 권도 읽지 않는다.
4. 단순해야 활용하기 쉽다
단순하지 않다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어렵다. 제목과 위치가 정리되지 않은 파일은 하드디스크에서 영원히 활용되지 않는다. 옷장을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무슨 옷이 있는 줄도 모른다. 디자인 면에서도 복잡한 옷은 활용도가 떨어진다. 복잡함은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는 어떤 식으로든 제거되기 마련이다. 단순해야 필요할 때 쉽게 찾아 쓸 수 있다. 단순하게 정리할수록 활용성이 좋아진다.